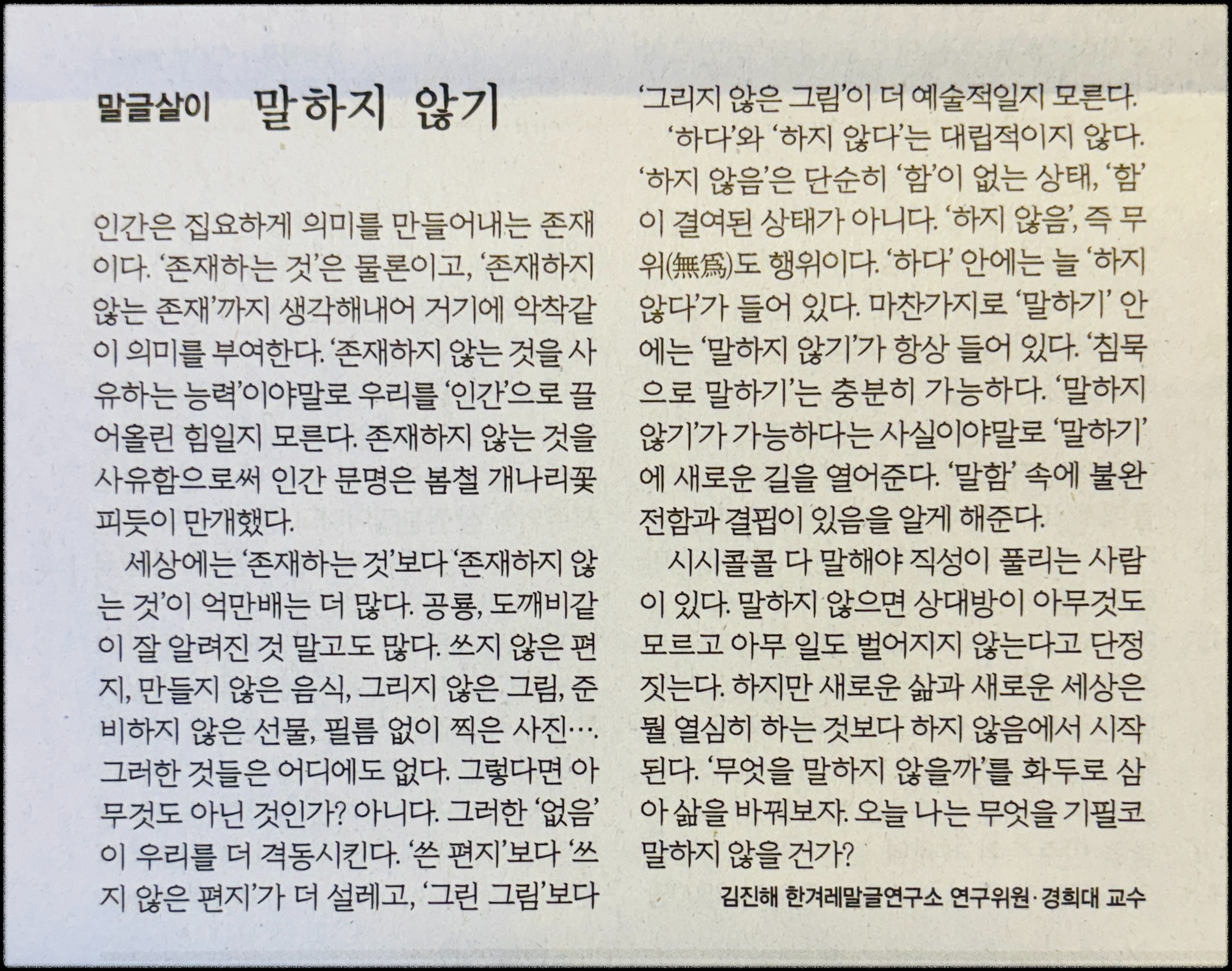
인간은 집요하게 의미를 만들어내는 존재이다. '존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존재하지 않는 존재'까지 생각해내어 거기에 악착같이 의미를 부여한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사유하는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인간'으로 끌어올린 힘일지 모른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사유함으로써 인간 문명은 봄철 개나리꽃 피듯이 만개했다.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억만배는 더 많다. 공룡, 도깨비같이 잘 알려진 것 말고도 많다. 쓰지 않은 편지, 만들지 않은 음식, 그리지 않은 그림, 준비하지 않은 선물, 필름 없이 찍은 사진···. 그러한 것들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아니다. '쓴 편지'보다 '쓰지 않은 편지'가 더 설레고, '그린 그림'보다 '그리지 않은 그림'이 더 예술적일지 모른다.
'하다'와 '하지 않다'는 대립적이지 않다. '하지 않음'은 단순히 '함'이 없는 상태, '함'이 결여된 상태가 아니다. '하지 않음', 즉 무위(無爲)도 행위이다. '하다'안에는 늘 '하지않다'가 들어 있다. 마찬가지로 '말하기' 안에는 '말하지 않기'가 항상 들어 있다. '침묵으로 말하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하지 않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야말로 '말하기'에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말함'속에 불완전함과 결핍이 있음을 알게 해준다.
시시콜콜 다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정 짓는다. 하지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상은 뭘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지 않음에서 시작된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까'를 화두로 삼아 삶을 바꿔보자. 오늘 나는 무엇을 기필코 말하지 않을 건가?
김진해 한겨레말글연구소 연구위원·경희대 교수


